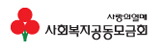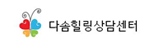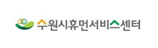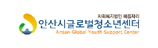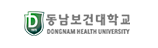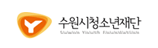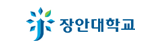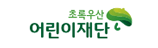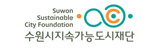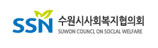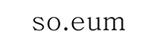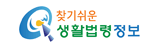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이주민도 우리들의 '좋은 이웃'입니다.
![]()
이주민 소식
자료실 게시물 내용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1> 열악한 주거 실태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699
- 등록일
- 2020-09-09
- 부산 이주노동자 1만3812명
- 국내 55% 작업장·가건물 거주
- 10명 내외 함께 기숙사 생활
- 코로나 감염 시 집단발병 우려
- 창문, 악취에 막아둬 환기 곤란
- 격리시설 가도 日 10만 원 부담
취업 목적으로 부산에 사는 이주노동자 1만3812명 가운데 대학교수나 연구·기술지도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전문인력은 2344명에 불과하다. 반면 단순 기능인력 취업자 수는 1만14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쇠락한 공단지역에서 한국인이 외면하는 업종을 도맡는다. 이주노동자의 타향살이 서러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건 무엇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별도 주거지가 아닌 공장 작업장 한쪽에 겨우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소음과 분진, 악취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늘 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소음 악취에 24시간 방치
국제신문 취재진은 10년째 강서구 녹산동 도금공장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출신 A(39) 씨의 기숙사를 방문했다. 4층 건물 옥상에 마련된 2명 정원의 컨테이너였다. 숙소 옆에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형 변압기가 종일 ‘윙윙’ 대고 있었다. A 씨가 생활하는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열지 못한다.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맞은편 공장에서의 악취 때문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한 직후 있으나 마나 한 창문을 막아버렸다. 공장 옥상에는 A 씨뿐만 아니라 몽골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여 명이 4, 5개 컨테이너 숙소로 나뉘어 함께 산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마치고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녹슨 샤워기 하나가 전부다. 게다가 이들이 사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어 1·2층 공장 안의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이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A 씨의 고용주는 월급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했다. 올해에는 공제금액이 21만 원으로 올랐다.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숙사비를 받는 거다. A 씨는 “사장님은 제가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제멋대로 기숙사비를 정한 뒤 이를 제하고 월급을 주지만,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A 씨는 항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강서구 녹산동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B(28) 씨의 기숙사는 A 씨보다 더 열악했다. 그는 공장 작업장 한쪽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다른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함께 생활한다.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작업장을 향하고 있어 열 수 없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옆 공장 담벼락에서 불과 2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종일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된 컨테이너라 한가운데 바닥은 움푹 꺼져 있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연신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방이 없어 방에서 취사한다. B 씨뿐만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8명의 생활도 비슷하다. B 씨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포와 욕설뿐이었다. 그는 “기숙사를 고쳐달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때론 발로 찼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더 침해받는다.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면서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는 직장은 물론 주거지도 잃는다. 출신 국가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자국 출신 이주민 집에서 얹혀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일하고자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숙소는 대부분 단체생활을 하는 기숙사 형태라 자가격리에는 부적당하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이 있지만 하루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본래 사업주가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이 드니 이주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올해는 특히 자가격리 장소 마련에 도움을 달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열악하지만 말 못해”
이들처럼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편은 대부분 열악하다. 2018년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4%가 공장 작업장 내에 주거공간이 있거나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17.1%는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과 어촌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주로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6~8명이 한 공간에 거주하는데,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는 이유로 매달 주거비 명목으로 20만~40만 원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 코로나 발병 시 집단발병 우려도 높다.
작업장 내 주거공간을 두거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는 별도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부담이 없고, 관리도 손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월 6일 밤 10시40분께 발생한 서구 암남동 수산물 가공 제조공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공장 2층과 10층 기숙사에서 쉬던 이주노동자 26명이 공장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다. 헬기를 이용한 소방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규모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공장과 주거지가 같은 공간 내 있다 보니 빚어진 아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을 보면 고용주는 기숙사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이주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에도 고용주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기숙사 실정에도 지난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1578개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는 노동청 인원은 8명에 불과해 기숙사 점검과 시정조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 국내 55% 작업장·가건물 거주
- 10명 내외 함께 기숙사 생활
- 코로나 감염 시 집단발병 우려
- 창문, 악취에 막아둬 환기 곤란
- 격리시설 가도 日 10만 원 부담
취업 목적으로 부산에 사는 이주노동자 1만3812명 가운데 대학교수나 연구·기술지도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전문인력은 2344명에 불과하다. 반면 단순 기능인력 취업자 수는 1만14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쇠락한 공단지역에서 한국인이 외면하는 업종을 도맡는다. 이주노동자의 타향살이 서러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건 무엇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별도 주거지가 아닌 공장 작업장 한쪽에 겨우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소음과 분진, 악취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늘 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소음 악취에 24시간 방치
국제신문 취재진은 10년째 강서구 녹산동 도금공장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출신 A(39) 씨의 기숙사를 방문했다. 4층 건물 옥상에 마련된 2명 정원의 컨테이너였다. 숙소 옆에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형 변압기가 종일 ‘윙윙’ 대고 있었다. A 씨가 생활하는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열지 못한다.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맞은편 공장에서의 악취 때문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한 직후 있으나 마나 한 창문을 막아버렸다. 공장 옥상에는 A 씨뿐만 아니라 몽골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여 명이 4, 5개 컨테이너 숙소로 나뉘어 함께 산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마치고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녹슨 샤워기 하나가 전부다. 게다가 이들이 사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어 1·2층 공장 안의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이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A 씨의 고용주는 월급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했다. 올해에는 공제금액이 21만 원으로 올랐다.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숙사비를 받는 거다. A 씨는 “사장님은 제가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제멋대로 기숙사비를 정한 뒤 이를 제하고 월급을 주지만,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A 씨는 항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강서구 녹산동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B(28) 씨의 기숙사는 A 씨보다 더 열악했다. 그는 공장 작업장 한쪽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다른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함께 생활한다.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작업장을 향하고 있어 열 수 없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옆 공장 담벼락에서 불과 2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종일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된 컨테이너라 한가운데 바닥은 움푹 꺼져 있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연신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방이 없어 방에서 취사한다. B 씨뿐만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8명의 생활도 비슷하다. B 씨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포와 욕설뿐이었다. 그는 “기숙사를 고쳐달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때론 발로 찼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더 침해받는다.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면서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는 직장은 물론 주거지도 잃는다. 출신 국가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자국 출신 이주민 집에서 얹혀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일하고자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숙소는 대부분 단체생활을 하는 기숙사 형태라 자가격리에는 부적당하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이 있지만 하루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본래 사업주가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이 드니 이주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올해는 특히 자가격리 장소 마련에 도움을 달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열악하지만 말 못해”
이들처럼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편은 대부분 열악하다. 2018년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4%가 공장 작업장 내에 주거공간이 있거나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17.1%는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과 어촌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주로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6~8명이 한 공간에 거주하는데,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는 이유로 매달 주거비 명목으로 20만~40만 원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 코로나 발병 시 집단발병 우려도 높다.
작업장 내 주거공간을 두거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는 별도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부담이 없고, 관리도 손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월 6일 밤 10시40분께 발생한 서구 암남동 수산물 가공 제조공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공장 2층과 10층 기숙사에서 쉬던 이주노동자 26명이 공장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다. 헬기를 이용한 소방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규모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공장과 주거지가 같은 공간 내 있다 보니 빚어진 아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을 보면 고용주는 기숙사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이주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에도 고용주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기숙사 실정에도 지난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1578개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는 노동청 인원은 8명에 불과해 기숙사 점검과 시정조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